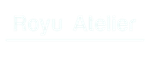2017. 7. 23. 21:23ㆍ서울시향 서포터즈
아우구스틴 하델리히라는 새로운 바이올리스트를 발견한 계기였다. 이전까지 들어본 이름이 아니었지만 최근에 서울시향이 초정하는 협연자나 지휘자의 리스트를 봤을 때, 꽤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고는 예상했었지만 이정도의 비르투오조일줄은 몰랐다. 바르토크 바이올린 협주곡을 이렇게 능숙하고, 쉽게 보이게(?) 연주할 수 있는 젊은 연주자가 몇이나 있을까?
우선 많은 바이올리스트들이 멘델스존, 차이코프스키, 브람스, 시벨리우스에서 허우적허우적될 때 바르토크 레파토리를 골라서 정말 좋았었다. 여기서부터 일단 호감이기는 했었다. 너무 뻔한 레파토리가 아니면서 바르토크의 역작을 연주하니 말이다. 이런 기대는 하델리히가 이 곡의 첫음을 긋는 순간부터 충족되었다. 하프의 짧은 솔로가 끝나고 등장하는 하델리히의 강력하면서 부드러운 첫번째 보잉은 정말 마음에 드는 스타트였다. 서울시향의 박지은 플룻 수석도 정명훈이 3마디듣고 뽑았다고 들었는데 왜 3마디듣고 뽑히는 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공연에서 하델리히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한 보잉과 정확한 아티큘레이션 그리고 또렷한 개별음이었다. (아마 앵콜로 자신있게 파가니니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음반을 들어보았지만 이런 템포를 유지하면서 한음한음 또렷하게 표현하면서 여유있게 연주하는 경우는 들은 적이 없었다. 특히 바르토크의 경우 요상한 템포에 괴상한 속주가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음들을 한 음도 놓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안정감있게 곡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다만...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두가 기억할 수 밖에 없는 그 '익룡 사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더니 이윽고 하델리히의 멋진 연주를 방해하고 객석 모두에게 폐를 끼치는 상황까지 가고야 말았다. 그 사건 덕분에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기억되야할 몇 부분들이 삭제되어서 매우 아쉽다.
뒤에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제임스 개피건에 대해서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할 듯 싶다.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후기를 보아하니 대체적으로 호평이지만 필자가 생각할 때, 이날 바르토크 반주는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이런 소극적인 면은 2부의 멘델스존 교향곡 5번 '종교개혁' 으로까지 이어졌다. 하델리히의 소리를 최대한 살려주고 오케스트라는 백그라운드를 담당한다는 의미는 알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델리히의 표현을 받아주고 다시 넘겨주는 과정이 있어야하는데 이날 제임스 개피건의 서울시향은 오로지 '서포트' 에만 안주했던 경향이 너무 뚜렸했다. 협주곡은 협연자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협연자와 지휘자,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이어진 멘델스존 교향곡 5번 '종교개혁' 은 최근의 기류와는 다른 멘델스존이었다. 최근 출시되는 괜찮은 멘델스존 교향곡들을 보면 대부분 작은 편성의 날렵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혹은 절충주의, 원전연주등 시대상을 반영해 연주하는 멘델스존이 큰 호응과 설득력을 얻고 있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가디너경과 LSO과 야닉 네젝 세갱과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의 음반등이다. 이런 음반 외에도 과거의 음반의 경우에도 멘델스존은 대체적으로 날렵함을 기본으로 바리에이션을 펼쳐가는 것이 주류였다.
그렇지만 개피건은 퍼스트 바이올린의 경우 얼핏 보아도 7풀트정도 되어보이는 인원을 가동시켰고 콘트라베이스의 경우 무려 8명이나 동원되었다. 주로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들에게서나 보일 듯한 편성이었다. 멘델스존의 편성은 대게 모차르트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수준이었지만 이 날은 그런 공식을 완전히 깨버린 편성이었다. 이렇다보니 원래 기대했던 멘델스존의 사운드보다 훨씬 두텁운 음색이 연출되었다. 부제가 '종교개혁' 으로 붙여진만큼 엄숙함을 강조하고 드라마틱한 면모를 강조하기에는 적절한 수준의 인원배치였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악기를 가지고 만들어낸 음악은 필자의 취향과는 거리가 있었다.
개피건은 멘델스존에 깊이 박혀있는 모차르트의 DNA를 말러의 DNA로 치환시켰다.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담으려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악 자체가 느슨해졌다고 생각한다. 멘델스존의 음악은 그렇게 많은 것을 담고있지 않은데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템포이다. 템포를 느리게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 음색을 더 표현한다던지, 아니면 빠른 템포속에서 죽어있던 소리를 찾아 음악적으로 소리를 더 풍성하게 한다든지 말이다. 그렇지만 이날 공연에서는 템포를 그리게 잡은 뚜렷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다. 더 커진 편성과 느려진 템포로 음악이 전체적으로 비대해졌다는 인식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었다.
그리고 리듬감이다. 느린 템포속에서도 정확한 리듬감을 잡아내고 앞뒤의 프레이징의 대비를 명확히 만들면 오히려 클라이막스는 더 짜릿해지느 면이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첼리비다케의 브루크너의 음반들이다. 첼리비다케의 다른 음반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이날 개피건의 해석에는 이런 리듬감에 대한 고려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악장이다. 얼마든지 리듬감을 표현해줄 수 있는 요소가 많았지만 이런 것들을 뚜렷히 잡아내기가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음색이다. 멘델스존의 음색은 필자의 고정관념일수도 있지만 밝고 화사한 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지휘자들이 그렇게 표현하였다. 마치 모차르트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개피건은 밝고 화사하기보다는 정명훈을 연상시키는 음색을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옅보였다. 마치 프랑스의 드뷔시, 라벨을 표현하기 적절한 색을 멘델스존에 대입해본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시도에 대하여 훌륭하다고 평가했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취향' 과는 거리가 있다. 필자가 느끼기에 이날 표현된 음색은 '물이 많이 들어간 유화' 이다.
'서울시향 서포터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시향 음악의 해학: 하이든부터 쇼스타코비치까지 (0) | 2017.08.31 |
|---|---|
| 서울시향 콘서트 프리뷰: 음악의 해학, 하이든에서 쇼스타코비치까지 (0) | 2017.08.27 |
| 하델리히의 바르토크 ver.2 (0) | 2017.08.21 |
| 콘서트 프리뷰: 하델리히의 버르토크 바이올린 협주곡 (0) | 2017.07.17 |
| 서울시향 카르미나 부라나 / 2017.07.05 (1) | 2017.07.06 |